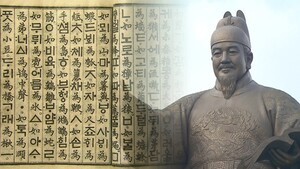신재철 목사 / 초원교회 원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고신교단은 1952년에 결성된 총로회 체제로 출발하여 1956년에 총회를 구성했다. 이 총회에서 분열된 고려총회는 1976년에 출발함으로 20년 차이가 난다. 고신총회는 고려총회가 형성되기까지 부산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였기에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석원태 목사를 중심으로 한 고려총회가 수도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더러 생기면서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 소송 문제로 고신교단이 내분이란 틈이 생기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생긴 고려 교단도 같은 내분을 겪음은 사필귀정인지 모른다. 이미 밝힌 대로 1984년에 고려신학교 34회를 중심으로 한 목사와 그들이 담임하던 교회들이 고려 교단을 떠나 고신교단으로 부분 통합했다. 이때 낙현교회(오인국 목사), 성산교회(박성대 목사) 등은 고려 교단의 중요한 교회였다. 이들 교회는 현재 고려 출신이 아닌 고신 출신의 목사들이 후임으로 담임하고 있다.


2001년에 고려 교단에서 54개 교회와 66명의 목사 등이 고신교단과 부분 통합했다. 고신교단에서는 이들을 위해 서경노회라는 무지역 노회까지 허락했다. 이때 합동한 선두교회(조석연 목사)와 의성교회(황영석 목사), 가좌동광교회(조용선 목사) 등은 고려 교단에서 경향교회의 뒤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장한 교회였다. 고려 출신 교회의 대표적 교회였던 이들 교회는 2024년 현재 모두 고신 출신의 목사들이 담임목사가 되었다. 1984년의 34회 때와는 달리 서경노회에 속한 목사들은 이런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수긍했다. 인천에 소재한 선두교회는 고려신학대학원 41회 졸업생인 곽수관 목사가 담임으로 청빙 받아 서경노회에 속하여 거의 대다수가 고려신학교 출신인 목사들과 교제의 폭을 넓혔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두교회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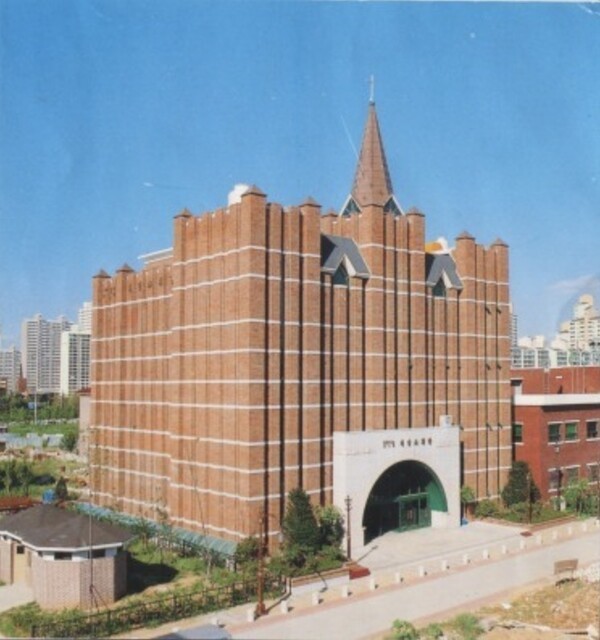

이런 점은 이어 다른 고려 출신 교회에도 고신 출신의 목사들이 담임으로 세워짐에 대한 거부감을 확연하게 줄였다. 그런 중인 2015년 9월 15일, 고신(총회장: 김철봉)과 고려(총회장: 천환)총회는 각각 제65회 총회를 열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와의 통합을 전격 가결하였다. 2001년 통합시의 조석연 목사도 고려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

하였지만, 당시의 통합은 양 총회의 통합은 아니었다. 석기현 목사가 담임하던 경향교회에서 분열되어 분리 개척되어 고신총회에 속한 하나인교회(현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고려 출신이 아닌 고신 출신의 김열 목사를 담임으로 청하였고 현재도 고신 출신의 한동은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천환 목사는 인천에 소재한 예일교회를 개척 단계에서부터 담임하다가 2022년 은퇴하면서 고신 출신의 목사가 후임으로 청빙 되었으나 1년이 못 되어 다시 후임이 왔으나 역시 고신 출신이었다. 고려 출신들은 예일교회의 후임으로 고려 출신이 세워지기를 기대하였으나 예일교회의 선택은 달랐다. 그러나 고려신학교 출신의 누구라도 이에 대해 드러내 놓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고신총회의 고려신학대학원은 천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파주에 있던 고려신학교는 2015년 통합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일부 고려신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이가 있었으나 명목상이었고 파주에 있던 고려신학교는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고려신학교 출신 중 상당수가 자신이 개척했거나 개척 단계의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한다. 은퇴하는 이들을 이어 담임목사가 되는 자원이 고려신학교 출신에는 거의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담임목사가 될 연령대의 목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려 출신들은 이런 점에서 고신총회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고려신학교 출신 중 청도의 풍각교회에 백준봉 목사가 부임하여 20년 사역을 마치고 12월 14일에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다. 김철온 목사가 광주의 월계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으나 길게 사역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규모를 갖춘 교회가 고신 출신이 아닌 고려신학교 출신을 청하였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조태현 목사가 한산도 교회를 거쳐 거제 희망교회의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주남호 목사는 함양 서상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에 고신 출신의 목사가 세워진 점을 생각하면 고려 출신들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된다.
양 총회의 통합역사를 기술하기에 이런 역사를 기록해 보지만 이제는 진정한 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고려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는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된 하나의 모습이 되어 오늘의 기록은 과거의 한 역사에 불과하고 모두가 고신총회 산하 하나의 교회가 될 뿐이다. 고려신학교 출신들은 통합하면서 고신총회의 정신에 꼭 필요한 반고소 사상을 다시 한번 고취를 시켰고 자신들이 개척했거나 섬겼던 교회에 고신 출신의 목회자들이 담임하게 함으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신학교 출신들은 신학생 시절 자신들이 세계적인 신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반고소 신학의 신학교였고 일정 기간이 흘러서는 이 신학교가 전 신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는 신학교란 의미 등에서였다. 하지만 전공 교수진의 부족과 약함은 통합하고 보니 전공 교수진을 갖춘 고려신학대학원 출신과는 차이가 남을 실감했다. 이는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깨어있는 목사들이 많은 이유가 된다. 그러나 고신 출신의 목사들은 고려 교단의 목사들이 보이는 동료애 특히 계명 중 이웃사랑에 있어 탁월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진정한 통합을 이룸에 있어 전자 즉 신학의 보완은 자연스럽게 평균화될 것이다. 고려 출신들은 때가 되면 은퇴하고 모두 고려신학대학원 출신들이 담임으로 사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후자 즉 동료와 이웃사랑은 고려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보완하여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 즉 외적 개혁을 넘어 내적 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합의 중요한 의미가 외적으로도 나타나야 하겠지만 내적으로 서로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 된 의미를 내적으로도 풍성하게 보여 분열된 한국교회에 하나의 사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