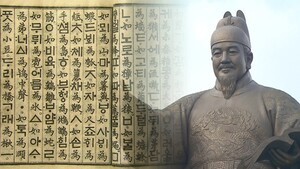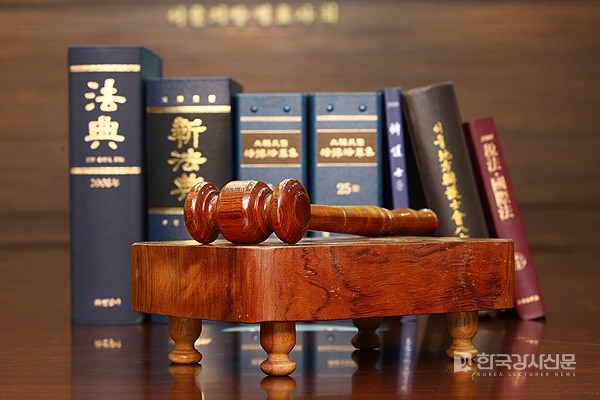

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박사,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 제28대 회장
그동안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자신과 무관한 분야로 여겨 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법률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리부서(기소위원회 또는 재판국)의 해(該) 당사자 지위(地位)에 오르면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거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들은 치리회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할 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과 태도를 견지(堅持)해 왔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생각이나, 실제로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법률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인 치리회 회원들(목사 및 장로)은 사전에 최소한의 법률 상식에 대한 소양(素養)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이 알아야 할 법 상식에 관한 법리(法理) 15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예장 교단(통합) 각급 치리회 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입헌주의
입헌주의(立憲主義-constitutionalism)란 “헌법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헌법(憲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헌법에 구속(拘束)하는 통치 원리를 의미한다. 입헌주의(立憲主義)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국가와 동일하게 종교단체에서도 이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와 종교단체가 ‘입헌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국민(종교단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입헌주의(立憲主義)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현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국민(구성원) 다수에 의해 제정된 「헌법」의 규정에 따라 통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입헌주의(立憲主義)는 단순히 ‘헌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의 자의(恣意)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그 중심 목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헌법을 통한 통치를 통해 국가를 전쟁의 도구로 만들어 통치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워 온 경우도 있어 진정한 입헌주의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the principle of legality)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刑法)의 기본 원리이다.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人權)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法律-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규범)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有害)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 두지 않는 한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나아가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한 행위라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서 형벌의 양을 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재판국)의 자의(恣意-제 멋대로 하는 판단과 처분)로부터 국민(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恣意)로부터도 국민(구성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법률에 정한 형벌과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총회 및 노회 수의)에서 ‘법률(헌법 및 헌법시행규정)’로 제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 ‘범죄(죄과)’이며 그 ‘범죄(죄과)’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성문법(成文法) 형식으로 정확하게 알게 함으로서 일반 국민(구성원)도 손쉽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 권징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형벌권을 실현할 때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하는데,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detective procedure by law’ 또는 ‘형사절차법정의 원칙’이라 한다.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절차에 적정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원칙에 부응하도록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의 강제력은 인신(人身)에 대한 조치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하여 때론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공공의 가치와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때 법령이 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해당 처벌 대상자의 인권이 과도히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인권보장 차원에서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게 함으로써 약자의 인권침해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를 ‘권징절차법정주의(勸懲節次法定主義)’라 한다(예장 헌법 권징 제6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80조 제5항 참조). 어떤 의미에서 교회법에서의 권징절차법정주의는 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4. 상위법우선의 원칙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월하여 우선 적용되며,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법을 국가법(國家法)이라 하는데, 국가법은 둘로 구분된다. 문자화된 법으로 만든 것을 성문법(成文法)이라 하고,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불문법(不文法)이라 한다. 성문법(成文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고(※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말하는 법조인도 있다), 불문법(不文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다. 성문법에 해당하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근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법체계상 모든 법 위에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법률(法律)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으로, 흔히 보통 법이라 말하는 ‘법률’을 지칭한다. 명령(命令)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율이다. 규칙(規則)은 행정기관 이외의 특수한 국가기관(국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이 제정한 법규이다.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이상의 성문법(成文法)과 함께 불문법(不文法)에 해당하는 판례법(判例法)은, 법원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내렸던 판결 중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慣習法)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법과 같은 인식이 굳어버린 사회 관행으로,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의 개념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조리(條理)는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승인된 공동적 사회생활 원리로 인식된 사물의 본질적 법칙, 도리를 말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 국가법(國家法)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성문법 5가지가 순서적으로 먼저 적용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된다(민법 제1조). 일반법(형법, 민법 등)과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중에서는 특례법이 우선으로 적용된다.
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할 때 각종 종교 활동의 내용과 방법, 종교단체의 존립과 질서,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를 규정한 것을 종교법(宗敎法)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개신교)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宗敎法)을 교회법(敎會法)이라 한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 교파의 교단법(敎團法)은 교회법(敎會法)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국가에서는 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종교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모든 종교 종파를 포함한 기독교 각 교파 및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법(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종교법(宗敎法)에 해당하는 장로교 교회법(敎會法)으로는 교단 헌법(교리, 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예배 모범 포함), 총회 규칙(규약, 규정 포함), 노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세칙 포함), 당회 규칙(정관, 규약, 장정 포함)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규칙 및 정관, 규약, 회칙이 있다. 각 교단의 헌법은 기독교 해당 교파의 최고법이며 모법(母法)으로 적용 순서에서 가장 우선한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 그리고 중심 치리회인 노회, 기초 치리회인 당회가 규정한 법규 순으로 법이 우선 적용되며, 상급 치리회 법이 하급 치리회 법보다 우선한다(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일반법과 제한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법이 우선 적용된다. 치리회 간에 이견(異見)이 있을 시는 상급 치리회의 규정과 결의가 우선 적용된다(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7항).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에 해당 되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新法)이 우선 적용된다(예장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5.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Bona fides-acting in good faith)은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하며, 윤리적 규범에 있어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권리(權利)의 행사나 의무(義務)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 하며(국가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항).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원칙으로서, 계약법인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私法)에도 적용된다. 심지어 일부 공법(公法)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장 교단 총회 재판국에서는 이 원칙을 자주 판례로 인용하고 있다.
6.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이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일정한 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 그러한 후행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된 것이어서, 후행행위대로 법률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야기된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 권리자의 그 후행행위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원칙이다. 금반언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국가 민법 제2조)에서 파생된 법리로, 영미법상의 Estoppel(금반언)의 원칙을 독일에서 수용하여 재구성한 법리이다. 국가 민법은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7.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lex certa)’이란 죄와 형을 이루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명확성이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재판국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규는 구성원 모두가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명쾌하게 규정되어 져야 하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애매모호한 규정은 사회나 구성원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입법자의 법적 인식이 중요하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입법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예장 교단의 권징법에서는 죄과와 책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형량을 부과하는 기준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8.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은 과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예장 교단에서는 ‘부목사시무목사즉시승계금지법(예장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과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일명 세습금지법, 예장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있어 교인들의 시무목사 청빙권이 제한되는바, 해당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부닥치면서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다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9.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형벌 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소급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2025년 9월에 종교단체에서 제정한 법이 그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까지 적용된다는 것이 소급효인데, 그리되면 당장에 증거나 관련 자료 등 재판을 준비하는 것부터, 갑작스레 수많은 범죄자가 양산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고 합리성을 보다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두게 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그 법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혹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적용 시점을 명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국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하여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종교단체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리에 속한다.
10.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原則)은 어떤 사건에 대해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재판 청구 신청)를 제기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미 결론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 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가 헌법 제13조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 헌법이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도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항에서 확정판결 난 사건은 다시 공소할 수 없는 면소(免訴)의 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과 동일성을 지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한 안건이 어느 단체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이 원칙은 동일 회기 중에만 한하여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규정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는데, 예장 헌법 권징 제50조 제2항과 제52조 제3항에서는 고소(고발 포함)를 취하한 자가 동일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고발)할 수 없도록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1.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原則-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은 형사 피고인의 경우 재판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국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장 헌법 권징 제71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판결 확정의 경우, 당회ㆍ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예장 헌법 권징 제34조). 국가 법원에 제기된 사건 재판의 경우는 검사나 피고인 모두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나 상고(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하지 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74조 참조),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교단 헌법 권징 제71조(판결 확정 전 무죄추정)에 의거하여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9)
12.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nemo judex/iudex sine actore)이란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심리나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예장 헌법에서는 ‘고발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과로 인해 피해 입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고소(예장 헌법 권징 제48조)나 증거를 첨부하여 제기하는 누구나의 고발(예장 헌법 권징 제51조)이 있어야 기소제기와 재판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재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해당 원칙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당사자주의(예장 헌법 권징 제27조)의 기본 원칙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판사 혹은 재판국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제88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인천동노회장의 ‘재판국의 재판 시 기소한 기소 내용으로 판결하는지? 아니면 기소한 범죄 내용 밖의 다른 죄명으로 재판국 임의대로 판결할 수 있는지?’의 질의 건에 대하여 제28번 해석에서 “불고불리원칙에 의해 기소 내용 범위 안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1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原則)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국가법에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상고)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항소, 상고)한 사건에서 상소(항소, 상고)심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예장 헌법에서는 권징 제103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의 경우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는 상고심에서는 파기자판 규정(예장 헌법 권징 제117조)으로 인해 원심의 파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소송절차인 재심에서도 피고인만이 청구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 그러나 앞으로 예장 교단 권징법 상고심에서도 국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4.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의原則)은 계약 체결 당시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대로의 구속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때 예외적으로 계약의 수정·해제를 허용하는 법리이다. 계약은 본래의 계약대로 준수되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치 못한 중대한 사정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사정은 계약의 객관적 기초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정변경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그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없어야 하며, 당초 계약대로의 구속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해야 한다. 예컨대, 민법 제218조의 시설변경청구권이라든가, 민법 제557조의 증여계약해제청구권이 이에 해당된다.
15.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失效의原則)이란 권리자가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信義誠實) 도리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그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162조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권리권의 시효를 잃을 수도 있다. ①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② 상대방이 ‘이제 그 권리는 더 이상 행사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경우, ③ 권리자가 갑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만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일 경우 등이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권리는 상황에 따라 소멸될 수 있음을 알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제때에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결론
국가나 공동체(교회 혹은 교단)에서 지도자의 위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도에 비추어 실제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각 치리회에서는 사건 처리 이후 그 처리 결과에 불복(不服)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사와 장로들은 법적 식견의 유무(有無)를 떠나 치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만의 논리를 펴며 사적 견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치리회 구성원(당회원, 노회원, 총회원)들의 법률 전문성(專門性) 결여로 안건 업무처리 이후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고 논쟁이 심화되곤 한다. 따라서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은 공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각종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自淨能力, self-purification capacity)을 기르고, 법적 전문성(專門性)을 갖춰야 한다. 예기치 않게 등장하는 각 치리회 내의 업무와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며 풀어나가는 성숙함(고전6:2)을 보여야 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副應)해야 한다. 이제 바라기는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위에서 제시한 법리(法理)를 명확하게 숙지하여 정의와 공평이 투명하게 실현되는 발전적인 공교회로 나가도록 선도해 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