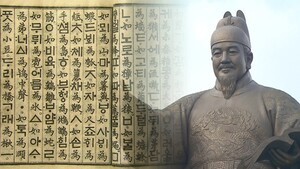공기화 /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ㆍ부산 땅끝교회 은퇴장로
- 농막農幕의 회상
황령산 아래 문현동 안동네 돌산마을에서 전포동 일대 넓은 밭을 ‘농막農幕’이라 하였다. 그곳은 논농사는 하지 못하고 산비탈에 밭을 갈아 보리, 콩, 옥수수, 수수, 고구마, 감자, 호박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였다.
여름날 넓은 수박이나 참외밭의 한가운데 있는 원두막은 한낮의 더위에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낮잠이라도 잘 수 있는 곳이고, 농막은 밭의 가장자리에 움막을 만들어 농기구를 보관했던 곳이다. 그렇다 보니 <소나기>의 원두막과 유사하지만, 낭만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농막은 밭과 집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 무거운 농사 도구들을 집까지 들고 오가기 힘드니까 움집을 만들어 호미, 괭이, 삽, 똥장군, 바가지 등 농기구를 보관해 두었다.
문현동 안동네에 군부대가 있었다. 6.25전쟁이 터지자 군부대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무자들은 부대 일대의 농막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좁은 농막에서 잠만 자고 그 앞에 나와 밥을 지어 먹으며 생활하였다. 그곳은 적산 토지가 많아 피란민들은 근처에서 움막을 지어 살았다. 혼자 지내기도 힘든 농막에 가족이 기거하려고 판자로 크게 집을 지어 살다 보니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웃에 있는 지게고개 위에서 바다가 보이는 수산대학교까지 넓은 벌판인 용주벌을 사이에 두고 제법 큰 못골, 동두름, 용소, 석포, 당곡 등 농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들은 초가나 기와집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그러나 문현동은 부산진시장으로 가는 교통 요지이나, 대연동과 풍경이 달리 철길이나 동천 강변과 언덕바지에 판잣집이 즐비하였다.
교통편도 버스가 다니는 대연동과 달리 전포동으로 가려면 버스 노선이 없었기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토 언덕을 바라보며 비포장 신작로를 걸어가야 했다. 그곳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끔 장작이나 채소를 싣고 가는 우마차와 마주치기도 한다. 어쩌다 차가 한 대 지나칠 때는 뿌연 먼지와 연기를 내면서 달아났다.
문현동에서 전포동으로 가려면 동천의 악취를 피할 수가 없었다. 해방 전에는 노하다리에서 잉어, 붕어, 꼬시래기와 같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던 동천이었지만, 전쟁 후에 피란민들이 생활오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냄새가 고약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어 청소년들은 ‘흑룡강’이나 ‘스와니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다.
가물 때에는 먼지가 풀풀 나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전포동으로 가는 그 신작로의 가에는 크고 작은 가게가 많이 있었다. 문이나 다다미 만드는 곳, 철공소, 말발굽 갈아 넣는 곳 등 하나 같이 제대로 지어진 집이 아닌 판자로 지어진 가건물이었다.
이곳에서 다리를 지나 동천 너머의 조방 앞에 가면 볼거리가 많았다. 철길 가에 몇십 권의 책을 펼쳐둔 헌책방, 각종 고물이나 골동품을 파는 가게, 부산에 고무신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 짝이 맞지 않는 불량 운동화를 무더기로 쌓아두고 정가의 1/5 정도의 가격으로 파는 곳도 있었다. 깡통으로 만든 재떨이나 등잔과 같은 생활용품을 파는 장사도 있고, 엿장수, 콩윷이나 주사위를 두고서 종지를 돌리는 야바위꾼, 지게꾼 등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밑바닥 인생의 만화경을 볼 수 있었다.
증조부와 아버지의 산소에서 바라보면 문현동과 멀리 전포동의 농막이 군데군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진달래가 붉게 피는 보릿고개쯤이면, 구상반려암球狀磐廬岩 위 사자봉 큰 바위에서 날아온 솔개가 농막의 보리밭 위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이곳을 망보고 있곤 했다. 암울했던 시대에도 녀석은 무척 배가 고팠나 보다.
요즘은 이곳 농막도 많이 변했다. 황령산 줄기의 진남로鎭南路에 많은 자동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다. 문현동의 농막이 있었던 곳에 온통 주택 지대이거나 공동묘지였던 돌산마을도 사라지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전포동 농막에서 내려다보였던 동천 변의 군부대가 국제금융단지가 되어 67층 고층 빌딩으로 멋진 신사처럼 하늘 높이 서 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원주의 교외에 농막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의 농막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어 좁은 창고인 농막을 임시 거주지로 삼았지만, 요즘의 농막은 부자가 별장으로 이용하거나 투기 목적의 불법 주택인 듯하여 눈살이 찌부러진다.
60여 년 전에 보았던 농막을 회상하니 세월이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간 듯하다. 아직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동천의 물이 맑아져 숭어가 무지개다리까지 올라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부산에 내려온다고 했던 산업은행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부산의 자존심인 국제금융단지가 높이 솟아 있어 그런지 농막 위에서 빙빙 원을 그리며 날았던 솔개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는 산속 어디에서 가난한 시대를 벗 삼았던 농막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언제 피어오를지 모를 황령산봉수대의 연기가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식들로 하늘 높이 피어올랐으면 한다.
| 공기화 장로 / 서울대를 졸업하고 부산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명예교수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거의 인생 전부를 보낸 토박이이기에, 남다른 애정으로 부산과 관련한 글을 즐겨 쓰면서 부산문인협회와 한국장로문인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